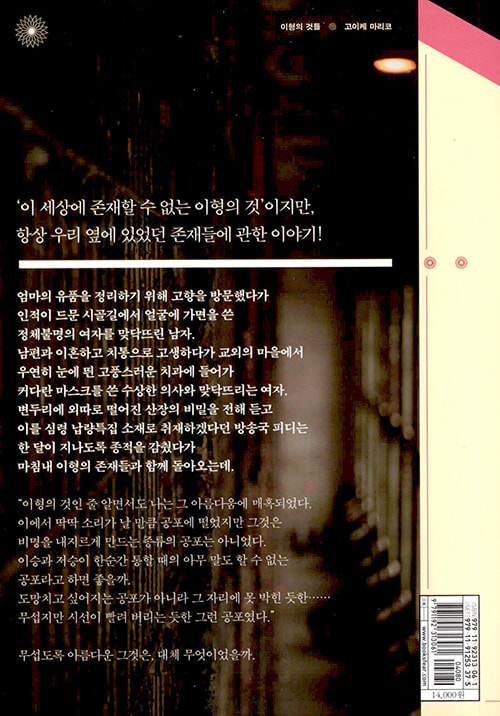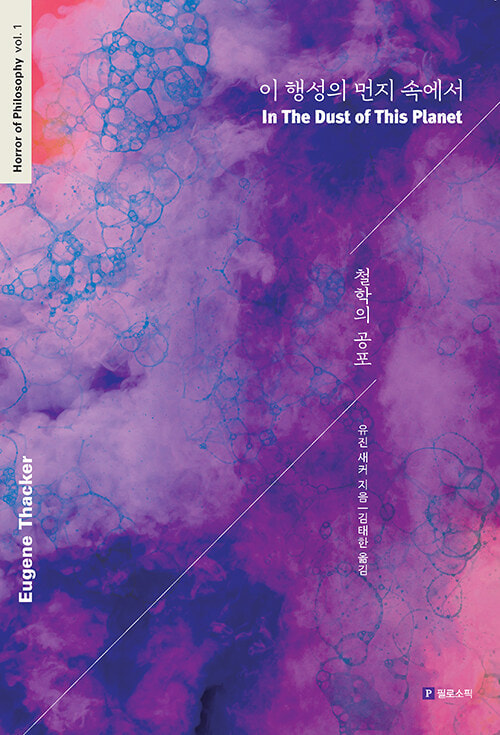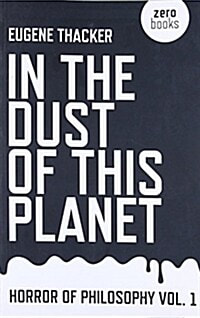|
원저: 小池眞理子(고이케 마리코) 번역: 이규원 출판: 북스피어 고이케 마리코(小池眞理子)의 2017년 발매작 <異形のものたち>의 번역본이 2022년 8월 북스피어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고이케 마리코의 책을 찾아보게 된 것은, 최근 읽었던 <이 행성의 먼지 속에서>에서 이형의 것이나 비현실적인,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책의 대표적인 저자로 언급한 문구를 읽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괴기소설이나 공포소설의 대가라느니 그와 유사한 다른 표현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대상에 대한 글로 명시해 둔 것에서 우선적인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 그보다 큰 부분은 괴기소설로 생각되지 않을 고전적이면서도 수려하고 아름다운 표현들의 대표적인 저자라 한 점에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나서였다.
한 사람이 외로움이나 쓸쓸함, 회한을 느끼도록 상황에 오랜 시간을 들여 조금씩 밀어 넣는 장치로 쓰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한 편에서는 일본 특유의(이는 오로지 내 주관적인 생각이며, 드라마나 소설 등에서 자주 접한 분위기로 이야기한다) 문화적인 공감대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불륜과 죽음은 매우 밀접하다. 인과관계의 밀접함이라기 보다는 개인과 타인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불륜은 인륜 혹은 도의적 측면에서 부적합하지만, 개인으로 본다면 아름다운 사랑 중 하나다. 이미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회의감이나 불편함을 갖는 세대가 두터워지고있음을 생각한다면, 불륜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도록 모두에게 강요함이 옳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불륜은 본인에게는 그 순간 무엇보다 큰 사랑으로 여겨지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회복될 수 없는 장애를 남긴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죽음은 개인에게는 안식이다. 그 과정이 자연스러운 죽음이든, 병으로 인한 것이든, 사고로 인한 것이든, 결과는 안식이다. 죽음 이후는 그 무엇도 없다. 종교적 혹은 개인적 이유로 사후에 더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만을 따져본다면 죽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최종적인 끝맺음이다. 하지만 죽음은 남겨진 자들에게는 거대한 슬픔이자 영원한 애도로 각인된다. 고이케 마리코의 단편 이야기들에서는 이와 같은 상반되거나 이질적인 감정이 함께 묻어 나온다. 편안한 분위기지만 무언가 불편하고, 밝은 환경에서도 어두움이 슬며시 끼어들어 스쳐 지나간다. 이형의 것들과 조우하는 것은 섬뜩한 공포라기 보다는 단순히 비이성과 비존재를 넘어선 하나의 교차점을 직시한 것일지도 모른다. 원저: 유진 새커Eugene Thacker 옮김: 김태한 출판: 필로소픽 원저 명은 'In the Dust of This Planet - Horror of Philosophy vol.1'이며 약간은 시간이 된 2011년 8월 경 출간되었다. 번역본은 올해 (2022년 8월) 필로소픽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책을 관통하는 관점은 '공포의 철학Philosophy of Horror'이 아닌, '철학의 공포Horror of Philosophy'다. 단순히 말장난 혹은 무의미한 수사라 느낄수 있겠지만, 저자의 관점과 목적은 확고하다. 공포를 철학적으로 해체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의미있지만, 소설이나 영화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이고 이해불가능한 근원적인 공포를 단순한 '형식'을 기반한 체계로 접근될 수밖에 없다. 반면 저자가 원하는 것은 철학과 공포의 관계가, 철학이 그 자체적인 한계와 제약을 넘어선, 사유 가능성의 경계에 대해 접근하는데 있다. 언어로 표현되고 이해될 수 있음은 그 자체로 공포가 아니며, 사유 불가능한 사유 자체로 공포를 접근한다. 1. 악마학에 관한 세 질문 질문 1 - 블랙메탈에서 단어 '블랙'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 2 - 악마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3 - 악마학에 대하여, 그리고 악마학이 존중받을 만한 연구 분야인지에 대하여 2. 오컬트 철학에 대한 여섯 강독 강독 1 - 말로의 <포스터스 박사의 비극>부터 괴테의 <파우스트> 1권까지 강독 2 - 휘틀리의 <악마가 타고 나가다>부터 블리시의 <검은 부활절, 또는 파우스트 알레프 널>까지 강독 3 - 호지슨의 <유령 사냥꾼 카나키>부터 텔리비전 드라마 <외부 경계>의 에피소드 <경계지>까지 강독 4 - 러브크래프트의 <저 너머에서>부터 이토 준지의 <소용돌이>까지 강독 5 - 실의 <자주빛 구름>부터 호일의 <검은 구름>, 밸러드의 <갑작스러운 바람>까지 강독 6 - <칼티키: 불멸의 몬스터>부터 <엑스: 언노운>, 라이버의 <검은 곤돌라 사공>까지 3. 신학의 공포에 관한 아홉 토론 토론 1 - 생 이후 토론 2 - 신성모독의 생 토론 3 - 에워싸는 재앙 토론 4 - 네크로스 토론 5 - 생물물학의 영혼 토론 6 - 일의적 피조물 토론 7 - 멸종과 존재 토론 8 - 비존재로서의 생 토론 9 - 익명적 공포 "검은 촉수형 진공의 저조파 속삭임The Subharmonic Murmur of Black Tentacular Voids" 저자는 공포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인간 중심적, 도덕률, 형이상학적인 관점들을 이야기한다. 누구나 말로 서술하진 않았어도 생각하고 있었을 방식으로 먼저 세계를 구분한다. 우리-세계(World)라는 인간이 지각하고 이해하며 사유할 수 있는 세계와 세계-자체(Earth)라는 공간적인 세계 그 자체를 말한다. 물론 우리-세계는 세계-자체에 종속되어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고 사용하고 탐험하고 이해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곳을 제외한 영역은 우리-없는-세계(Planet)으로 이야기된다. 결국 공포는 우리-없는-세계로부터 기인하며, 이는 지구 내부적으로 흘러나오기도, 외부에서 다가오기도, 혹은 마법의 원이나 마법의 공간과 같은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대상들을 통해 겹쳐지거나 납작하게 눌려 하나로 합쳐지기도 한다. 우리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것에서 공포를 느끼곤 하는데 초자연적이라 묶어 미지의 영역으로 미뤄두는 것은 또 다른 자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이라기 보다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인간 중심적 이해를 벗어나기 때문에 공포가 되는 자연이다. 공포를 다루는 매체에서 접하는 외계나 다른 차원, 심연 등으로의 진입에서 모든 변화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무한한 미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곧 문턱을 한 걸음 넘어가는 순간부터 인간성과 지구 중심주의terrestrialism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존재의 '이름'에 대한 관점과 '죽음', '생'에 대한 것도 다룬다. 특히, 나의 생 이후의 무한한 비존재와 내가 존재하기 전, 곧 나의 생 이전의 무한한 비존재의 대칭적인 형상 속에서 잠시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생을 이야기하는 쇼펜하우어의 정서에 대한 것도 좋았다. '나의 생 이후의 무한이 나의 생 이전의 무한보다 더 두려울 건 없다. 둘을 분리하는 것은 그 사이에 끼어든 덧없는 인생이라는 꿈life-drea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에 대한 질문은 철학의 역사를 통틀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장 거대한 질문이며,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묻혀 조금은 '숨김'되는 관점이기도 하다. 화학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라는 조각들은 일반적으로 없어지거나 변화하거나 생겨나지 않으며, 생이 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가 순환해 다른 생에 깃든다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과연 유기체에 대한 철학적 관점에서 과학적 순환의 의미가 어느정도나 있을지 곰곰히 생각해보게 된 기회였다. 철학책을 즐겨 읽지는 않는다.
제목부터 표지, 내용과 사용되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딱딱하고 복잡하고 과하게 함축되어 있는 형상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정확히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이 행성의 먼지 속에서'도 읽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과학 서적같은 경우에는 300~400 페이지가 되도 하루면 편안하고 가볍게 쭉 읽어나갈 수 있는데, 단 220여 페이지에 불과한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3일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내가 과학에 관심이 많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읽기 편하고 간단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런 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철학자였고, 한평생 철학을 공부해 온 사람이었다면, 이 정도 책은 그냥 가볍게 화장실에 앉아 잡지 한 권 읽듯이 독파해 좋은 내용이네~ 하며 기억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도 서로 다른 분야 교수들끼리의 업적 평가의 공정성이나 정량적인 당위성에 대해서는 끝없이 이야기가 나온다. 철학이라는 분야가 어려운 것인지, 문외한의 입장에서 접해서 복잡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하다. 올 하반기 철학 내구성은 다 소모된 듯 하다. 의지와 표상의로서의 세계도 보려 했지만 내년으로 미뤄야겠다. 저자: 츠지무라 미즈키(つじ村深月) 번역: 문지원 출판: 블루홀식스(블루홀6) 추가정보: 양장본, 총 504쪽 야미하라는 '00하라'라는 표현으로 일본에서 흔히 사용되는 괴롭힘에 관련된 단어다. 영어 harassment에 방식을 줄여 말한 00가 붙게 되는데, 성희롱(세쿠하라), 직장괴롭힘(파와하라), 정신적 괴롭힘(모라하라), 음주괴롭힘(아루하라) 등이 대표적이다 (옮긴이의 설명 참고). 책 제목인 야미하라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둡게 조장하는 방식의 괴롭힘으로 이해되며, 어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곳에서 최근 많이 언급되는 '가스라이팅'과 유사하게 느껴진다. 공포를 강조하는 소설 중 그다지 무서운 소설은 없다. 아마도 소설이라는 글로 제공되는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읽고 해석하며 장면과 분위기를 상상해야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인듯 싶다. 나에게 그만큼의 상상력이 부재함일수 있고, 같은 장면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직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극적으로 놀래키고 혐오를 유발하며 감정을 궁지에 몰아넣는 영화 등은 공포라는 장르에 적합하다. 공포 관련 소설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완벽히 짜여져 소름이 돋는 플롯 구성에서 되살아나는 공포가 아닌 이상 책은 무섭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느낀다. 단순히 이 책을 구입해 읽어본 것은 우연이었다. 저자 츠지무라 미즈키는 2004년 '차가운 학교의 시간은 멈춘다(冷たい校舎の時は止まる)'로 메피스토 상을 수상하며 데뷔한다. 이 책은 만화책으로도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읽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후에도 소설가로 끝없이 성공을 이어간다. 2011년 '츠나구(ツナグ)'로 제32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신인상을, 2012년 '열쇠 없는 꿈을 꾸다(鍵のない夢を見る)'로 147회 나오키상을, 2018년에는 '거울 속 외딴 성(かがみの孤城)'으로 제15회 서점대상을 수상한다. 이런 츠지무라 미즈키가 처음 시도하는 호러 장편 미스터리 소설이 바로 야미하라(闇祓)다. 거울 속 외딴 성도 만화도로 발매된 뛰어난 추리소설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야미하라는 아주 즐겁게 읽은 책이었다. 500페이지로 짧지는 않았지만 번역도 잘 읽혀서 몇 시간만에 다 읽을 수 있었다.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야기한다면, 공포라 해서 비현실적인 배경에 압도되는(e.g. 러브크래프트) 방식도 아니며, 갑작스럽게 뛰쳐나오거나 놀라게 만드는 방식의 공포도 아니다. 물리적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극한에 집어 넣는(e.g. 좀비물) 종류도 아니었다. 오로지 감정적으로 독자를 가두고, 말 그대로 야미하라의 상황 속에 넣고 나를 지켜보는 등장인물들의 눈초리를 느끼게 만드는 현실적인 공포감이 있었다. 물론 완전히 현실적 배경에 충실해 추리나 과학, 실마리의 확인으로 우리 상상 속 결말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적절히 애매하고 적당히 오묘했지만 확연히 받아들여진다. 표현이 참 좋은게 많다. 좋다고 함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와닿는다는 말이 더 옳겠다. '학교라는 곳은 기이한 장소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학년이 되든 어느 반에 속하든 교실 안에는 뚜렷한 계급이 생긴다. 스쿨 카스트라는 단어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역시 그렇구나, 하고 무심코 공감하고 말았다. 반에 존재하는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위나 아래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저마다 관심 대상이 다를 뿐이지 어느 쪽이 더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깨닫고 만다. 적극적인 부류와 소극적인 부류, 화려한 부류와 수수한 부류, 시끄러운가, 조용한다. 확실히 상위 계급이 적극적이거나 화려하고 시끄러운 경향이 있기에 발언권이 강하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그것은 무신경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무신경한 부류가 마음이 약한 부류보다 '위'라고 불린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다.' - 츠지무라 미즈키, '야미하라' 1장 전학생에서 발췌 학교나 주민관계, 교우관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야미하라의 상황들은 인위적인 소설 속 존재들에 의해 가해진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조금은 비현실적인 내용들.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달라진다면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들.
이 모든 것이 가상에서 현실로 스멀스멀 검게 넘어오며 답답함과 두려움을 키워나간다. 각각의 상황 속 야미하라들은 (책에서는 챕터로 구분됨) 결국 하나의 결말을 맞는다. 결말까지 완벽했는가 묻는다면 난 그렇다고 본다. 정확히는 이 외의 방식으로 모든 현실적이고 직면하기 시작한, 그리고 하나의 절대적 해결책이 없는 야미하라들을 봉합해 결말로 이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느낌을 남겨주기도 한다. 마음 속에 울림을 일으키거나,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는 많이 다른. 어두운 스멀거림이 물러나간 곳에 남아있는 시커먼 흔적으로. |
아카이브 |